바로 얼마전 지난 7월에는 교토에서 일본의 인디 게임 페스티벌 '비트서밋'이 열렸다. 8월 16일에는 한국의 인디 게임 페스티벌 'BIC 2024'가 시작됐다.
일본의 인디 게임 관련 오프라인 이벤트로는 '비트서밋(BitSummit)'이나 '도쿄 게임 던전', '도쿄 인디 게임즈 서밋(TOKYO INDIE GAMES SUMMIT)'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BIC(Busan Indie Connect Festival)'라고 불리는 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다. 10회째를 맞이한 한국 'BIC 2024'는 부산의 BEXCO에서 개최되며(한국 최대의 게임쇼인 지스타와 같은 장소다), '개발자의, 개발자에 위한, 개발자를 위한 행사'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일본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디 게임쇼이기 때문에, BIC의 역사를 잠깐 들여다보자.
처음 시작은 2015년이었다. 당시 아시아에서 인디 게임 축제는 아직 드물었고(당시 일본의 비트서밋도 2013년에 막 시작되었다), BIC가 탄생한 것은 한국 게임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행사가 그렇듯, 시작은 아주 소박했다. 소박했다고 했지만, 일본의 첫 비트서밋 출품 수가 약 40개였던 것을 고려하면, 시작 시점에서 꽤 큰 규모였던 것 같다.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서 열린 작은 행사였던 첫 번째 BIC는 전시 타이틀이 80여 개 정도였고, 국내 인디 개발사들만 참가했다고 한다.
첫 BIC는 소규모이면서도 참가자들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고(이런 것이 보통인 것이 한국의 장점이다), 성공적인 행사를 치른 이 행사는 이후 연례행사가 됐다. 2016년, 2017년에는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시작됐다. 일본으로 치면 문화청, 관광청, 스포츠청이 합쳐진 듯한 행정 기관이다. 국가 차원이 아니더라도, 2017년 7월에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 게임 산업 신육성 계획'의 5대 전략 중 하나로 '인디 게임 생태계 구축'이 포함됐고, BIC는 그 연장선상에서 순조로운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그 무렵에는 출품 타이틀 수가 100개 이상이 되었고, 이웃 나라 일본과 중국에서의 참가도 늘어나 인디게임쇼의 국제적 색채도 풍부해졌다. 부산 영화의 전당, 부산 e스포츠 경기장, 부산항 컨벤션 센터 등의 행사장을 거치면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된 것도 이 무렵이다.

그리고 2018년경부터는 완전히 글로벌 행사로 변모했다. 출품 타이틀 수는 300개를 넘었고, 참가 개발자 수는 500명 이상이 되었다.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출품이 늘어났으며, 동시에 다양한 워크숍도 개최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BIC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이벤트로 성장하는 과도기였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 이벤트로 전환되었지만, 그것도 비상사태 해제와 함께 하이브리드 개최로 전환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이번 BIC는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며 인디게임의 미래를 전망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기념비적인 10회째를 맞이하는 것이다. 10회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출품작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작년 대비 121% 증가한 245개의 타이틀이 전시된다고 한다. 물론 '타이틀 수'만으로 좋고 나쁨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최근 비트서밋 출품 수가 270개라고 하니,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일본인인 필자가 보기에 한국은 일본보다 대형 업체들이 강하다. 대기업이 출자와 흡수를 반복하며 더 큰 규모로 성장해 가는 경향이 강해 '소규모 팀'이나 '중소 게임사'의 존속이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나 중국 쪽은 '인디'라는 환경이 유지되기 쉬운 것 같다. 하지만, 그런 한국이기 때문에 인디 게임 행사는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일본이나 미국, 중국에서도 인디게임 행사는 큰 의미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그 존재 가치가 크다.
요즘은 국가를 불문하고 '도대체 어느 쪽이 인디인가'라고 묻고 싶은 작품이나 팀도 많다. 다만, 아직 '인디'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 같아서 '당신이 인디라고 하면 인디'라는 인상이 강한 느낌이다.
한국의 인디게임 행사는 이런 대형 업체 중심의 시장 구조에 한 획을 긋는 역할이 있다. 100억 원 규모의 개발비를 쓰는 대형 게임업체에서는 만들 수 없는(아니, 허락받지 못하는) 주옥같은 아이디어를 게임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다. 유저들도 거기에 가치를 느끼고, 그것을 재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팀을 비롯한 인디 게임계가 크게 활성화되고, 그것이 피드백되는 형태로 대형 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인디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대형 업체의 손에 의해 '세계'로 유통되고,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주옥같은 아이디어'가 인디에서 탄생한다.
닌텐도나 소니 플랫폼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인디게임이라는 장르는 이미 업계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모두가 아는 대형 업체들은 인디게임을 눈여겨보고 있고(어떤 인디게임 행사에도 그들은 대부분 참석하고 있다), 투자를 하든 투자를 하든 영입을 하든, 마치 생쥐를 잡으려는 듯이 눈을 부릅뜨고 있다.

뭐,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빼더라도 인디 타이틀이 모이는 행사는 그런 대형 업체들에게 좋은 어필의 장이 되고(인디라고 해도 몇 명만 모이면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관람객이나 관계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장이 된다.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아시아 3대 게임 강국(이라고 잠정적으로 표현하고 싶다)인 일본, 한국, 중국 중 가장 게임에 대해 우호적인(?) 나라는 한국이다. 사회의 이해도, 정부의 이해도, 유저의 이해도 등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런 한국은 과거 PC 온라인게임의 강국이었고, 지금도 훌륭한 개발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그들이, 혹은 그들의 활약을 보고 자란 젊은 세대가 인디 개발자로 출항하고 있으며, PC방의 영향으로 PC게임의 보급도가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스팀과의 궁합도 매우 좋다. 이러한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으로 한국의 인디계는 점점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말하는 인터넷 카페는 개인실이나 만화, 숙박 코스 등 '힐링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일본과는 달리 '놀기 위해' 가는 곳이 한국의 PC방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PC 게임을 하러 간다고 한다. PC방 자체는 1992년에 등장했지만, 게임을 하는 장소로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은 1998년 '스타크래프트'의 붐이 일면서부터다.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 넥슨 '던파 페스티벌' 쇼케이스 총정리, 태초 무기와 악세 지급](https://cdn.gamevu.co.kr/news/thumbnail/202511/53630_55992_3032_v15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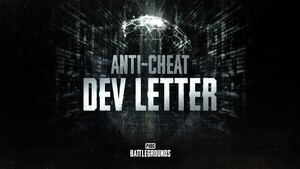






![[현장] 모험가 지갑 털 준비 완료, 넥슨 '던페 20주년' 굿즈 총정리](https://cdn.gamevu.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53616_55884_4252_1763786572_330.jpg)

![[현장] 지스타 2025 ‘성지’가 된 코스프레 현장, 완성도와 다양성 빛나](https://cdn.gamevu.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53320_54677_3715_1763091436_330.jpg)

![[현장] 지스타 신작 즐기고 받자! 고퀄리티 굿즈 모음](https://cdn.gamevu.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53273_54381_5415_1763009656_33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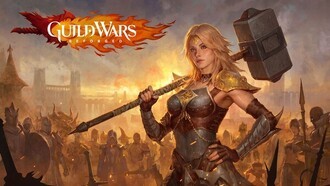












![[영상] 창세기전 모바일, '서풍의 광시곡' 공개](https://cdn.gamevu.co.kr/news/thumbnail/custom/20251126/53707_56279_614_1764122775_180.jpg)


